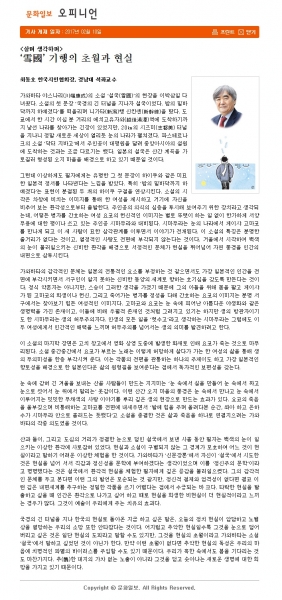
‘雪國’ 기행의 초월과 현실
최동호 한국시인협회장, 경남대 석좌교수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소설 ‘설국(雪國)’의 현장을 이박삼일 다녀왔다. 소설의 첫 문장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까지 하얘졌다’를 떠올리며 니가타(新潟)행 신칸센(新幹線)을 탔다. 도쿄에서 한 시간 이십 분 거리의 에치고유자와(越後湯澤)역에 도착하기까지 낯선 나라를 찾아가는 긴장이 있었지만, 20㎞의 시즈미(志都美) 터널을 지나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 눈의 나라가 펼쳐졌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닥터 지바고’에서 주인공이 대평원을 달려 중앙아시아의 설원에 도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했다. 일본의 설국은 산간 계곡을 가로질러 형성된 오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필자에게는 유명한 그 첫 문장이 하이쿠와 같은 미묘한 일본적 정서를 나타낸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밤의 밑바닥까지 하얘졌다’는 표현이 분절된 두 개의 하이쿠 구절을 연상시킨다. 소설의 시작은 차창에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한 여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환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주인공의 의식의 심층을 투시해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병자를 간호하는 여성 요코의 헌신적인 이미지는 별로 뚜렷이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서양무용에 대한 평이나 쓰고 있는 주인공 시마무라와 대비된다. 시마무라는 눈의 나라에서 게이샤 고마코를 만나게 되고 이 세 사람이 묘한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소설의 특징은 분명한 줄거리가 없다는 것이고, 열정적인 사랑도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울에서 시작하여 백색의 눈이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환각을 배경으로 서정적인 문체가 현실을 뛰어넘어 자연 풍경을 인간의 내면으로 삼투시킨다.
가와바타의 감각적인 문체는 일본의 전통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일본적인 인간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서구인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동양의 세계로 향하는 호기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정식 약혼자는 아니지만, 스승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위해 몸을 팔고 게이샤가 된 고마코의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죽어가는 병자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는 요코의 이미지는 분명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성적인 이미지다. 고마코와 요코는 눈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야생화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고, 이들에 비해 우월적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생의 방관자이기도 한 시마무라는 생의 허무주의자다. 인생의 모든 일을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시마무라는 그럼에도 이 두 여성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며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고치 창고에서 영화 상영 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요코가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소설 중간중간에서 요코가 부르는 노래는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가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생의 무의미성을 한층 부각시켜 준다. 이는 작품의 전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도 하고 가장 일본적인 향토성을 배경으로 한 일본인다운 삶의 원형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보편성을 갖는다.
눈 속에 갇혀 긴 겨울을 보내는 산골 사람들이 만드는 지지미는 ‘눈 속에서 실을 만들어 눈 속에서 짜고 눈으로 씻어서 눈 위에서 말리는’ 옷감이다. 이런 산간 오지 마을의 풍경은 눈 속에서 만나고 눈 속에서 이루어지는 밋밋한 무채색의 사랑 이야기를 뿌리 깊은 생의 현장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요코의 죽음을 울부짖으며 비통해하는 고마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발에 힘을 주며 올려다본 순간, 쏴아 하고 은하수가 시마무라 안으로 흘러드는 듯했다’고 소설을 종결한 것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연결지으려는 가와바타의 작중 의도였을 것이다.
산과 들이, 그리고 도심의 거리가 정결한 눈으로 덮인 설국에서 보낸 사흘 동안 필자는 백색의 눈이 일으키는 이상한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현실과 소설이 구별되지 않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어느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이다. 가와바타가 ‘신문장론’에서 자신이 ‘설국’에서 시도한 것은 현실을 넘어 서서 직감과 정신성을 문학에 부여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며 이를 ‘정신주의 문학’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은 설국에서 환각적 현실을 체험한 필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감각적인 문체를 두고 본다면 이런 그의 발언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정신적 절제와 엄격성이 없다면 결코 이런 깊은 내면세계를 추구하는 정밀한 작품을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긍되는 바 크다. 타락한 현실을 탈출하고 싶을 때 인간은 환각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때로 현실을 희생한 비현실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효과다.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 한국의 현실로 돌아온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의 정치 현실이 암담하고 노벨상을 열망하는 우리의 소망 또한 안타깝다는 것이다. 어지럽고 추악한 현실일수록 그것을 눈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실의 도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현실의 초월이라고 가와바타는 소설 ‘설국’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이런 초월이 없다면 추악한 현실의 독성은 우리의 마음에 치명적인 파멸의 바이러스를 주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한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추(醜)한 대지의 가차 없는 노출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 글은 문화일보 2017년 2월 10일 (금)자 에 전재한 기사입니다.>
<원문 링크주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1001033711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