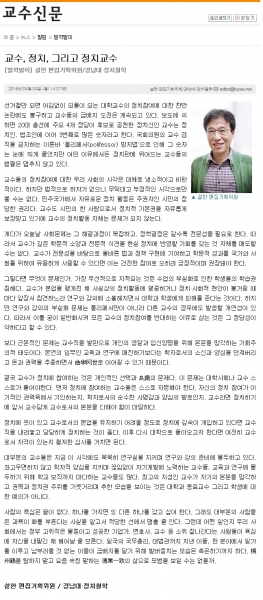
교수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무턱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주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교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기에 교수의 정치활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오늘날 사회문제는 그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정책결정은 갈수록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수가 깊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적 식견을 현실 정치에 반영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교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법과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 학문적 성과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건전한 참여로 오히려 긍정적이며 권장돼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수업의 부실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 교수가 본업을 팽개친 채 사실상의 정치활동에 열중하거나 정치·사회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앞장서 참견하느라 연구와 강의에 소홀해지면서 대학과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와 강의의 부실화 문제는 폴리페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의 경우에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일반화시켜 모든 교수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로 삼는 것은 그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수직을 발판으로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위해 본분을 망각하는 기회주의적 태도이다.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학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던져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면서 曲學阿世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과 良識의 문제다. 이 문제는 대학사회나 교수 스스로가 풀어야한다. 먼저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 참여가 이기적인 권력욕에서 기인하는지, 학자로서의 순수한 사명감과 양심의 발로인지. 교수라면 정치하기에 앞서 교수답게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치에 뜻이 있고 교수로서의 본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정치하는 것이 옳다. 이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여전히 교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심사를 거치면 된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히 연구실을 지키며 연구와 강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하는 교수들,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학교 보직까지 마다하는 교수들도 많다. 최고의 지성인 교수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과 정치권 주위를 기웃거리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학과 동료교수 그리고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욕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고위직은 물론이고 성공한 기업가, 변호사, 교수 등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욕심에 자신을 내맡긴 채 헤어날 줄 모른다. 일국의 국무총리, 대법관까지 지낸 이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楊州鶴을 탐하지 말고 요즘 속칭 말하는 德業一致의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는 없을까.
[기사원문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345


